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 개의 장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과 과학’, ‘뇌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나도 문과 남자이다. 물리학은 어려웠고, 화학과 수학은 다른 세계의 언어와 같다. 다른 파트에 비해 가장 분량이 적었던 ‘수학’은 첫 문단만 읽고도 포기했다. 그나마 흥미로웠던 것은 역시 ‘뇌과학’과 ‘생물학’이었다.


뇌과학자들이 내게 용기를 주었다. ‘뉴런은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거꾸로 뉴런의 연결 패턴에 영향을 준다.’ 자아가 뇌에 그저 깃들어 있는 게 아니라 뇌를 형성하고 바꾼다는 말이다. 물질이 아닌 자아가 물질인 뇌를 바꾼다니, 신기하지 않은가? 내 뇌는 매순간 퇴화하고 있다. 내 자아는 날마다 어리석어지는 중이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덜 어리석어지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내 뇌의 뉴런이 순조롭게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책을 읽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세상과 연대하며 낯선 곳을 여행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뇌에 새로운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뿐이다. 어리석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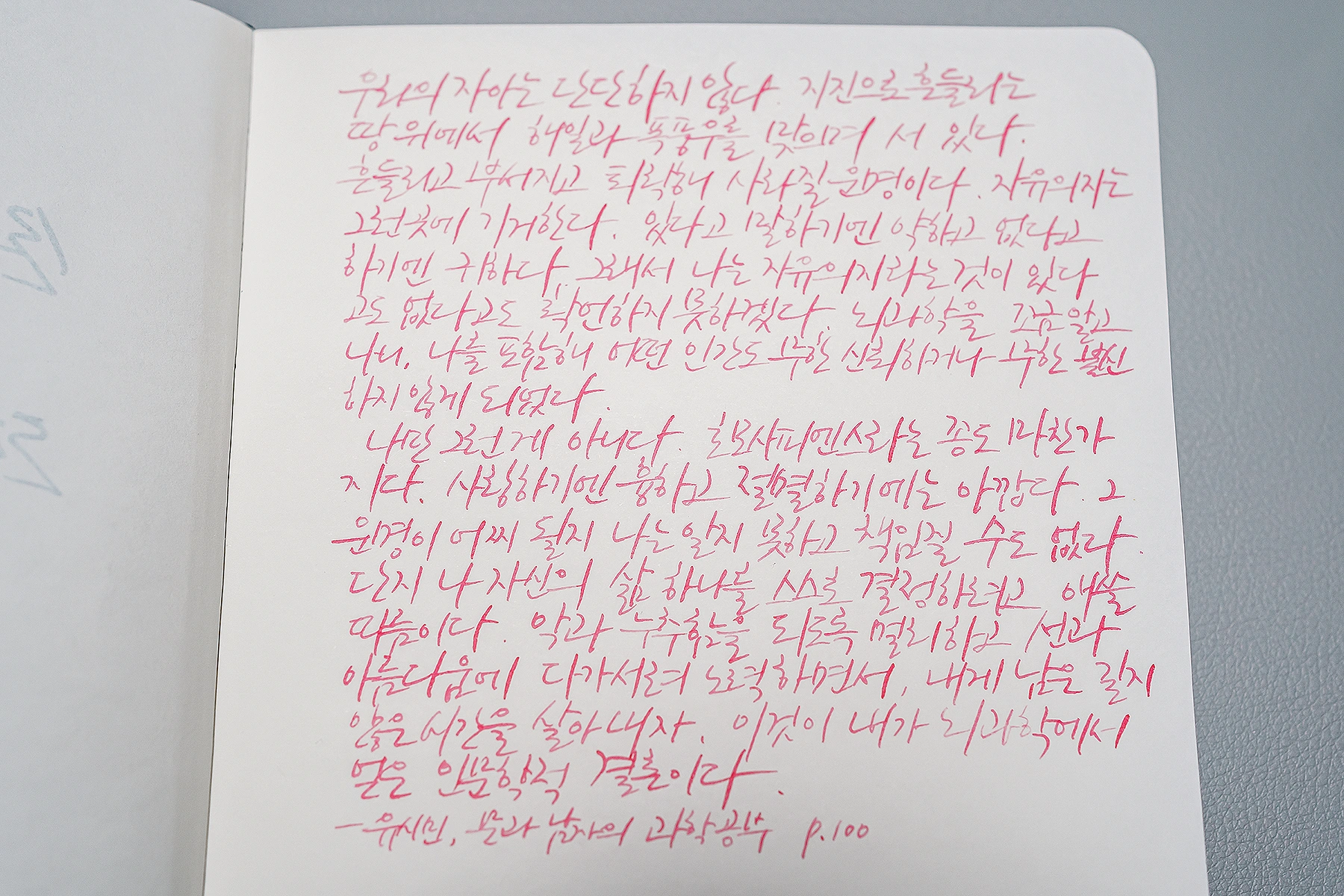
우리의 자아는 단단하지 않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땅 위에서 해일과 폭풍우를 맞으며 서 있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퇴락해 사라질 운명이다. 자유의지는 그런 곳에 기거한다. 있다고 말하기엔 약하고 없다고 하기엔 귀하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확언하지 못하겠다. 뇌과학을 조금 알고 나니, 나를 포함해 어떤 인간도 무한 신뢰하거나 무한 불신하지 않게 되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기엔 흉하고 절멸하기에는 아깝다. 그 운명이 어찌 될지 나는 알지 못하고 책임질 수도 없다. 단지 나 자신의 삶 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쓸 따름이다. 악과 누추함을 되도록 멀리하고 선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려 노력하면서, 내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자. 이것이 내가 뇌과학에서 얻은 인문학적 결론이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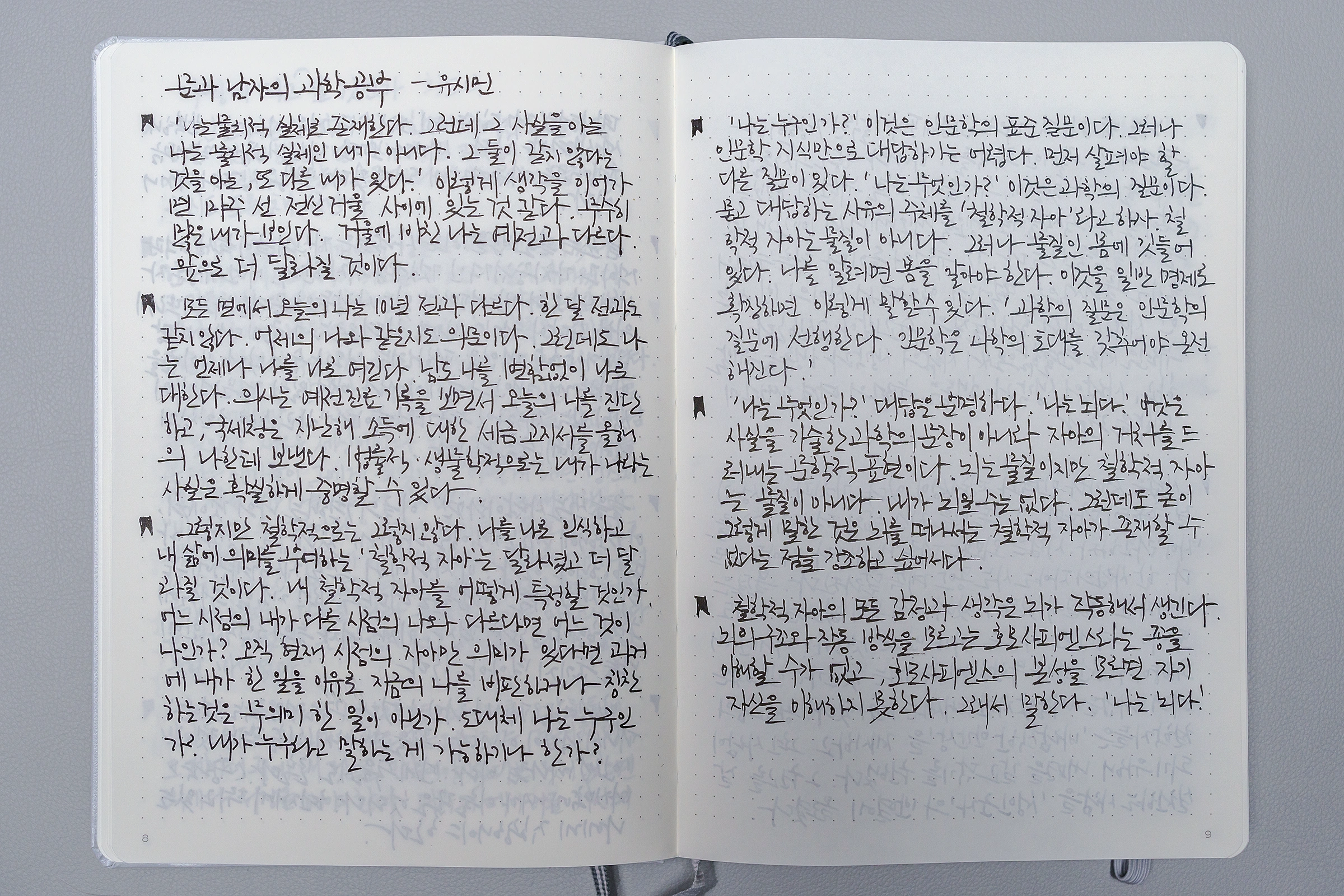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나는 무엇인가?’라는 과학적 질문으로 접근했다. 묻고 답하는 사유의 주체인 ‘철학적 자아’는 실체가 있는 물질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자아는 물질인 뇌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나’를 알려면 ‘몸’을 알아야 한다. 결국 ‘과학의 질문은 인문학의 질문에 선행하며, 인문학은 과학의 토대를 갖추어야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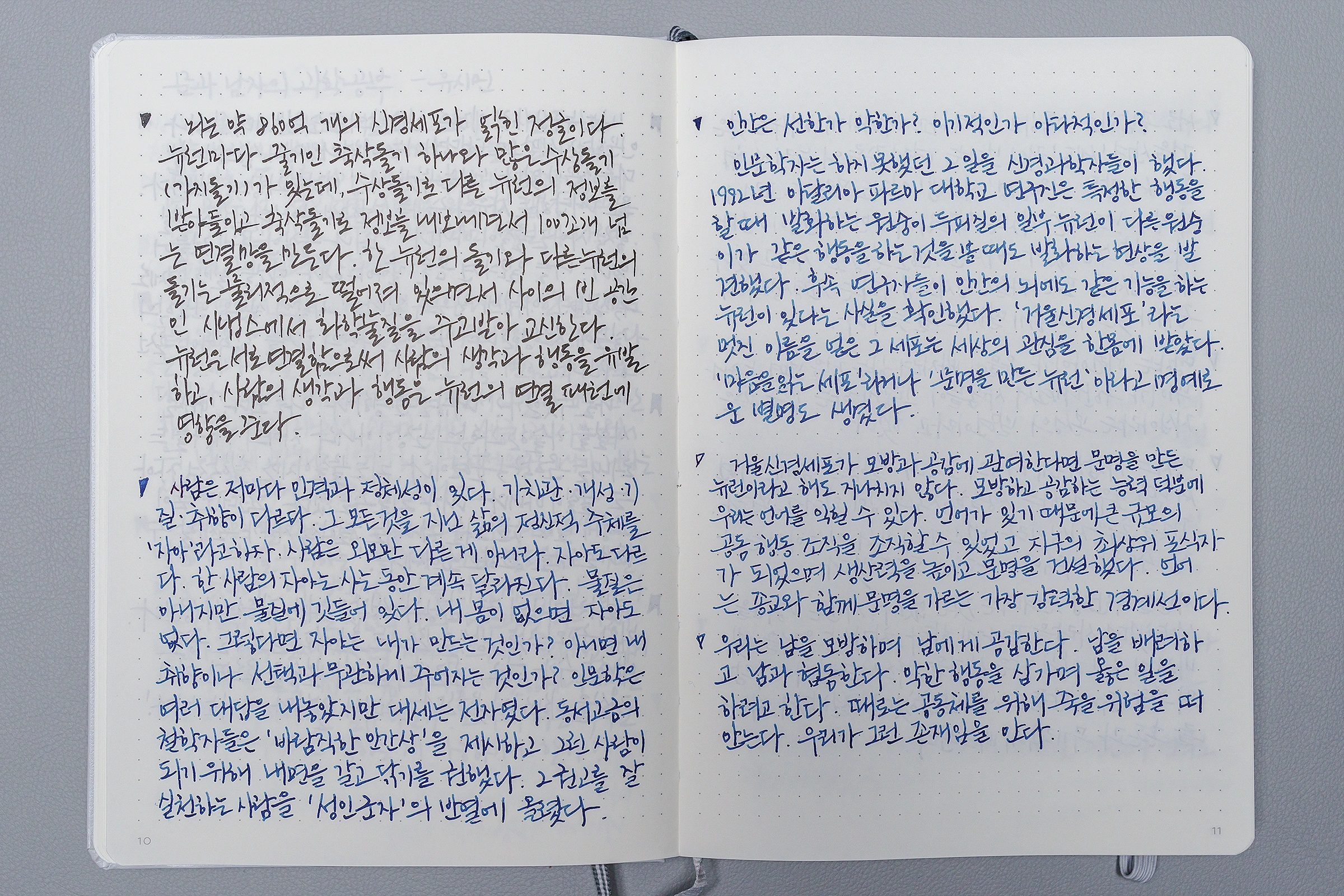
“과학을 전혀 몰랐을 때 나는 세계를 일부밖에 보지 못했다. 타인은 물론이고 나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전체를 보지는 못하며 인간을 다 이해하는 것 역시 아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더 다양한 관점에서 살핀다. 과학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과학의 이론을 활용하면 인간과 사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작가의 말에 동감한다. 과학의 지식과 이해는 ”나는 왜 이럴까?’와 ‘저들은 왜 저럴까?’에 대한 질문에 ‘이해’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살펴’ 볼 수는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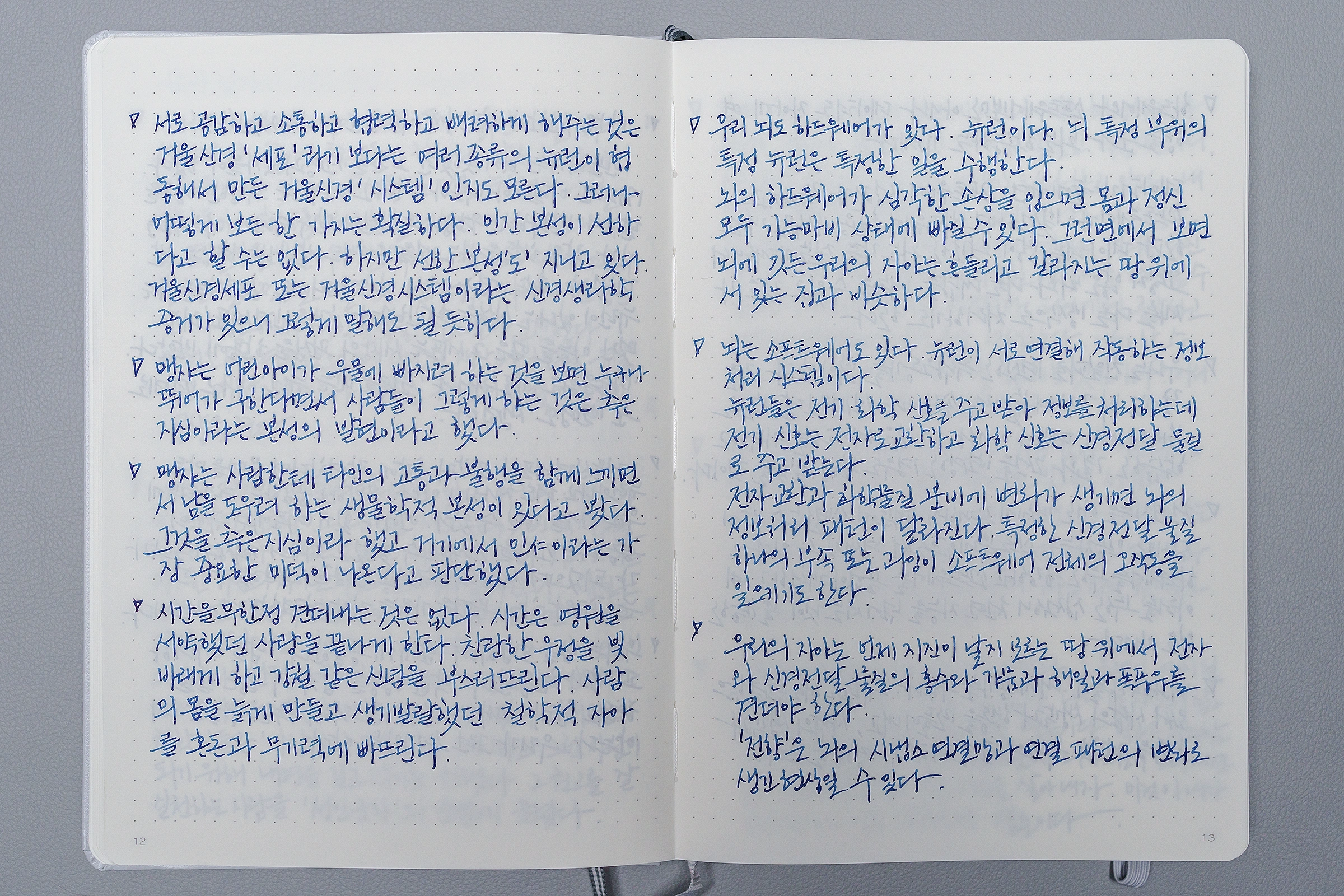
“나 자신의 삶 하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애쓸 따름이다. 악과 누추함을 되도록 멀리하고 선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려 노력하면서, 내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자.”라며 장을 맺는 작가의 문장은 어른이 갖는 ‘고귀한 태도’로, ‘가슴’ 속에 깊이 남았다.(과학적 사실은 ‘뇌의 어딘가’ 일테지만.)

뉴런은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거꾸로 뉴런의 연결 패턴에 영향을 준다.
“자아’가 ‘뇌’를 바꿀 수 있다.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유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