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너, 넌 무엇을 기대했나?

밀리의 서재를 뒤적거리다가 낯익은 책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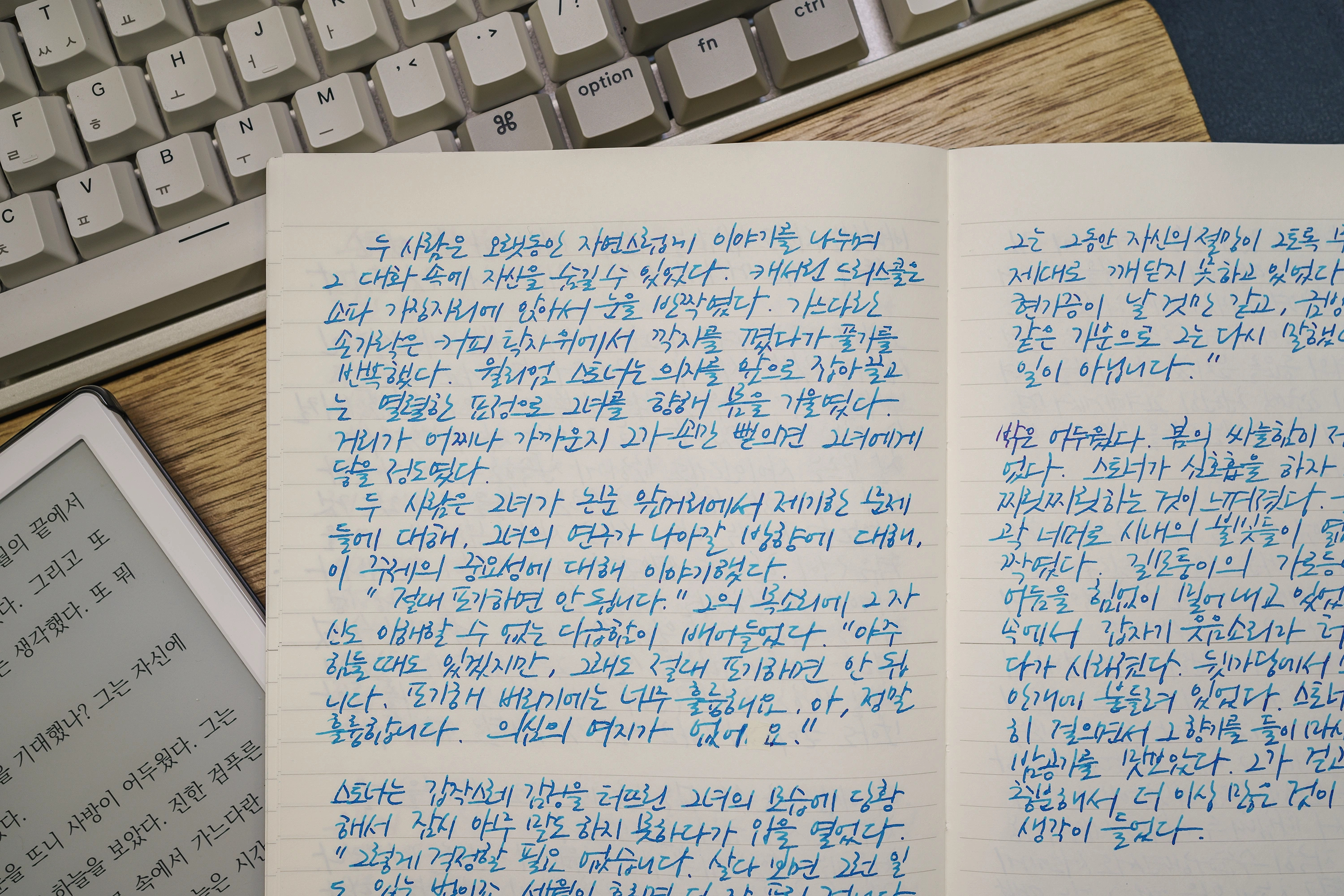
60년 전에 발표된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는 작가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만에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스토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문학을 사랑했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자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스토너의 청년기부터 노년까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그저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주인공 또한 그다지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다. 하지만 <스토너>는 기어이 마지막 장까지 읽게 만드는 담백한 힘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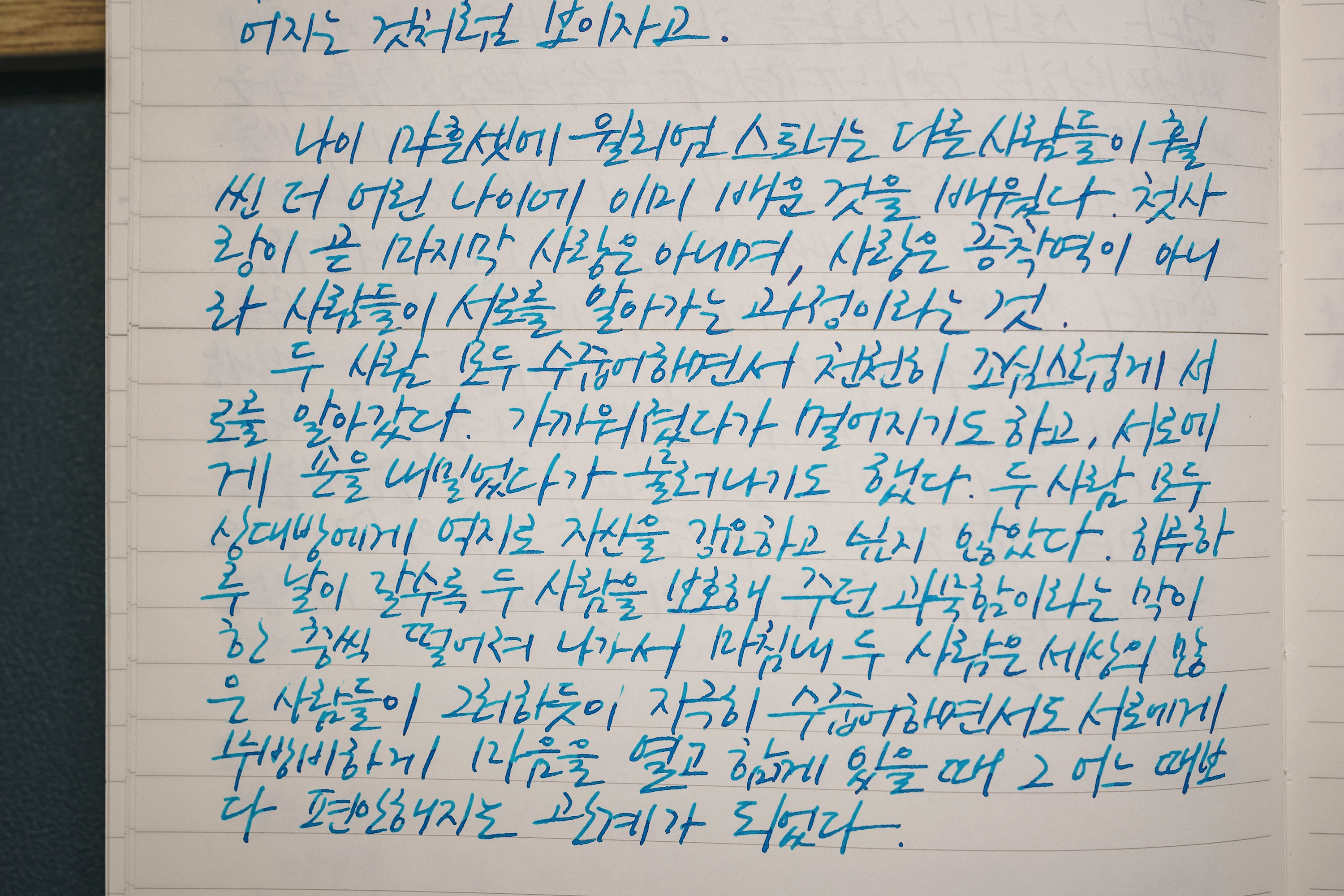
다시 책을 들었을 때, 주인공이 등신 같았다는 느낌만 가물거릴 뿐 내용은 전혀 기억나질 않아 처음 읽는 것과 다름없었다. 재미있는 건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전과 같이 묘한 불편함을 느꼈다.
인간은 빛을 향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생긴다. 그리고 빛이 강하고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선명하고 짙어진다. <칼 융 분석 심리학>에서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은 “우리 모두에게는 무시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림자’는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자아와 대비되는, 무의식 속의 ‘어둡고 열등한 자아’를 뜻한다. 그림자는 개인의 경험,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형성되며, 자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적이거나 억압된 특성, 감정, 생각들을 포함한다.
형편없는 자아를 마주하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아를 자신조차 볼 수 없도록 무의식 깊은 곳에 처박아 버린다. 자신 뒤에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투영하는 이 과정을 ‘그림자 투사(Shadow Projection)’라고 칼 융은 말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나의 그림자가 타인에게서 발견되었을 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때문에 불편했던 건, 어쩌면 스토너에서 어둡고 열등한 자아를 마주한 건지도.
잠깐, 아니. 많이 옆으로 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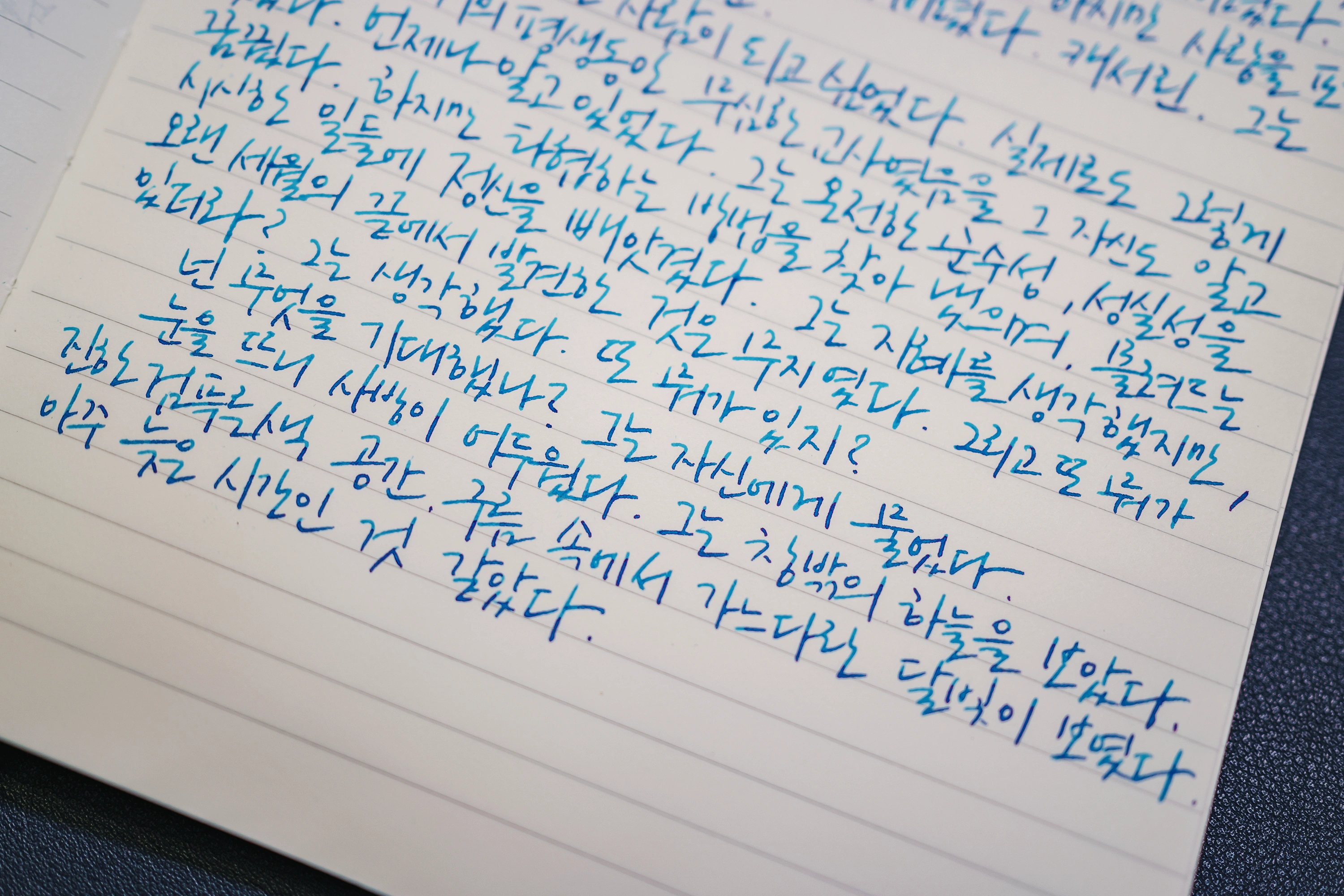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남들 눈에 틀림없이 실패작으로 보일 자신의 삶을 관조했다. 그는 우정을 원했다. 자신을 인류의 일원으로 붙잡아줄 친밀한 우정. 그에게는 두 친구가 있었지만, 한 명은 그 존재가 알려지기도 전에 무의미한 죽음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저 멀리 산 자들의 세상으로 물러나서……. 그는 혼자 있기를 원하면서도 결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연결된 열정을 느끼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열정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열정이 죽어버렸다. 그는 사랑을 원했으며, 실제로 사랑을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고, 가능성이라는 혼돈 속으로 보내버렸다. <중략>
그는 또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지만, 거의 평생 무심한 교사였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언제나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한 순수성, 성실성을 꿈꿨다. 하지만 타협하는 방법을 찾아냈으며, 몰려드는 시시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겼다. 그는 지혜를 생각했지만, 오랜 세월의 끝에서 발견한 것은 무지였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는 생각했다.
또 뭐가 있지? 넌 무엇을 기대했나?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답답했던 이야기는 종반으로 가면서 편안해졌다.
스토너는 자신에게 물었다. ‘넌 무엇을 기대했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실패. 그런 것이 무슨 문제인가? 우리의 인생과 비교하면 정말 하잘것없다. 생각하기에 따라 세상의 시간도, 우주의 시간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내게 묻는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했나?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