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

‘부조리’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종종 부정행위나 어긋남을 의미하는 말로 쓰인다. 하지만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말한 부조리는 그런 실용적인 개념이 아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앞뒤가 맞고 논리가 통하면 우리는 그것을 “조리 있다”고 표현한다. 반대로 부조리는 그 질서와 의미의 기대가 무너진 상태, 다시 말해, 세상과 내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나는 그 틈을 가리킨다.
카뮈는 부조리를 이렇게 정의한다.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세상은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고, 살아 있는 이유를 찾고, 그럴듯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모든 열망을 뒷받침해 줄 확실한 이유나 구조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충돌, 바로 여기에 부조리가 있다.

사막의 왕, 1화 모래 위의 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매일같이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 애쓰다가도, 문득 멍하니 “나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분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현실이 낯설고, 모든 게 덧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 허무함을 마주하는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철학이 시작되는 지점일지 모른다.
카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삶이 의미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다만 그것을 삶의 결론으로 삼지는 말 것.” 무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끝장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을 시작하는 존재가 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반항하는 인간’이 된다. 절망을 받아들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허무함 속에서도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인간 말이다.
카뮈는 이 이야기를 신화 속 인물 ‘시지프’에게 투영한다. 시지프는 신들의 벌로 인해 커다란 바위를 산 위로 끝없이 밀어 올리는 형벌을 받는다. 바위는 매번 정상을 눈앞에 두고 다시 굴러 떨어지고, 시지프는 또다시 처음부터 그 바위를 밀어야 한다. 영원히. 그는 무언가를 완성할 수 없으며, 어떤 의미 있는 결과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데 카뮈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일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런데도 바위를 다시 밀기 위해 산 아래로 걸어간다. 바로 그 순간, 그는 패배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자기 운명을 자각한 채, 어떤 환상도 없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카뮈가 말한 반항이고, 의미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태도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Nothing matters.
Feels nice, doesn’t it? If nothing matters, then all the pain and guilt you feel for making nothing of your life goes away.
Sucked, Into, A bagel…
전부 다 부질없다는 것.
기분 좋지 않아? 다 부질없는 거면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괴로움과 죄책감이 사라지잖아.
빨려 들어갔네. 모두 베이글 속으로….
Jobu Tupaki,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떠오른 영화가 있다. . 이 영화의 조이, 혹은 조부 투파키는 수많은 우주를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베이글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 살아 있는 것조차 지치는 세계. 무수한 가능성이 오히려 무의미를 강화시키는 멀티버스의 절망. 어쩌면 조이는 부조리의 무게를 더는 견디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인 에벌린은 다른 선택을 한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우주,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마치 시지프가 굴려야 할 바위를 깨닫고도 그것을 다시 밀어 올리는 모습과 겹쳐진다. 완전한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순간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에벌린의 선택은 세계가 침묵할 때조차,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대답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작은 선언이다.
무의미 속에서도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이 작은 ‘반항’이야말로, 카뮈가 말한 진짜 자유일지도 모른다. 반항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매일 바위를 올려야 하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잃지 않는 태도다.
나는 몇 달째 이 시지프 신화를 붙잡고 씨름해왔다. ‘반항하는 삶’은 멋지게 들리지만, 때때로 너무도 막막하게 느껴진다. 의미 없는 세계를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아무 대답도 없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나를 붙든다. 아직 답을 얻은 건 아니지만, 그 질문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반항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의미 없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한 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시지프처럼, 바위를 또 밀기 위해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가는 그 장면에, 어쩌면 삶의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First acknowledges how dark everything is, how meaningless it all is. Then I can be like, “Okay, now we can have a conversation, convince me why there is still beauty,” or whatever.
먼저 모든것이 끔찍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여전히 남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Daniel k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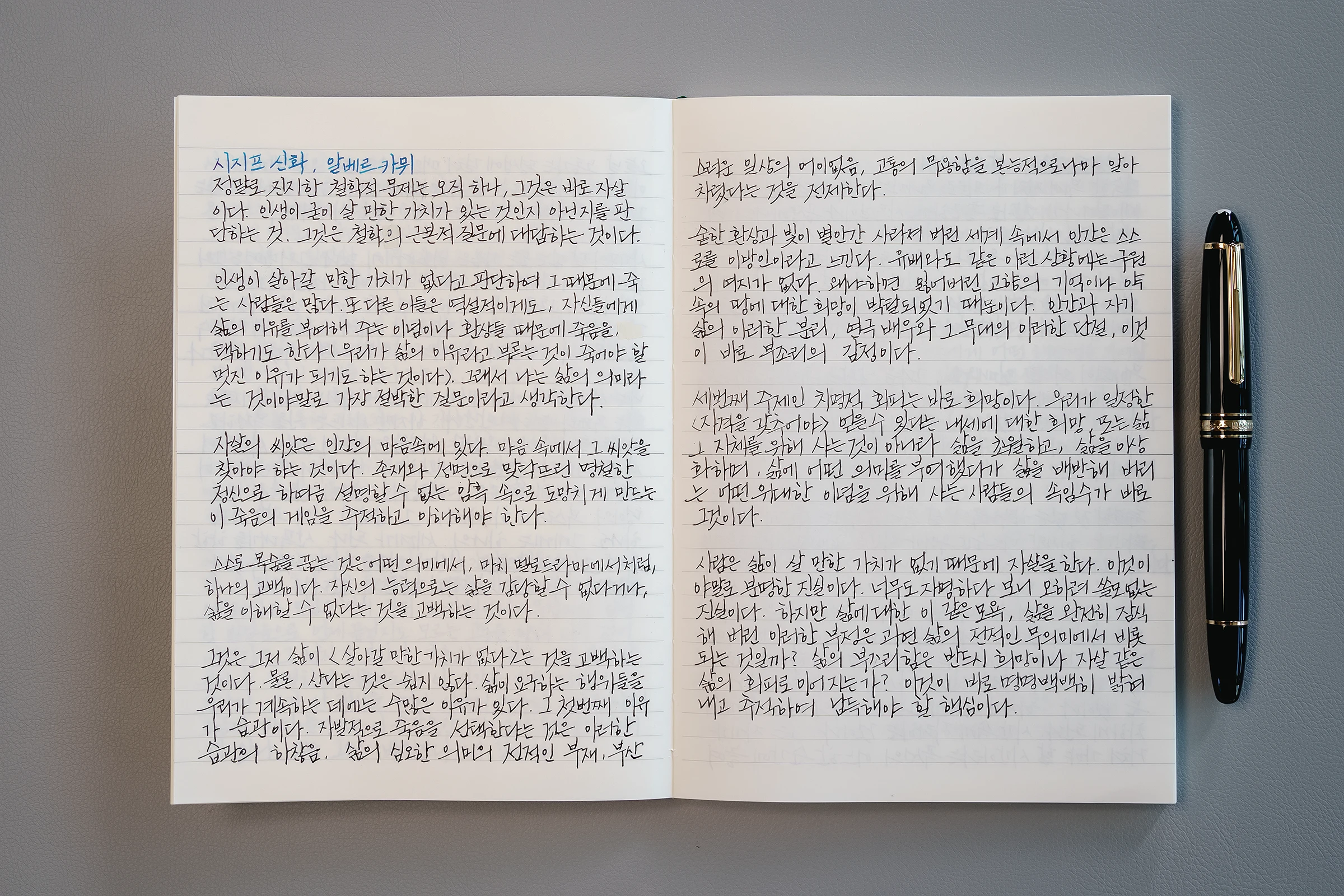
정말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굳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은 철학의 근본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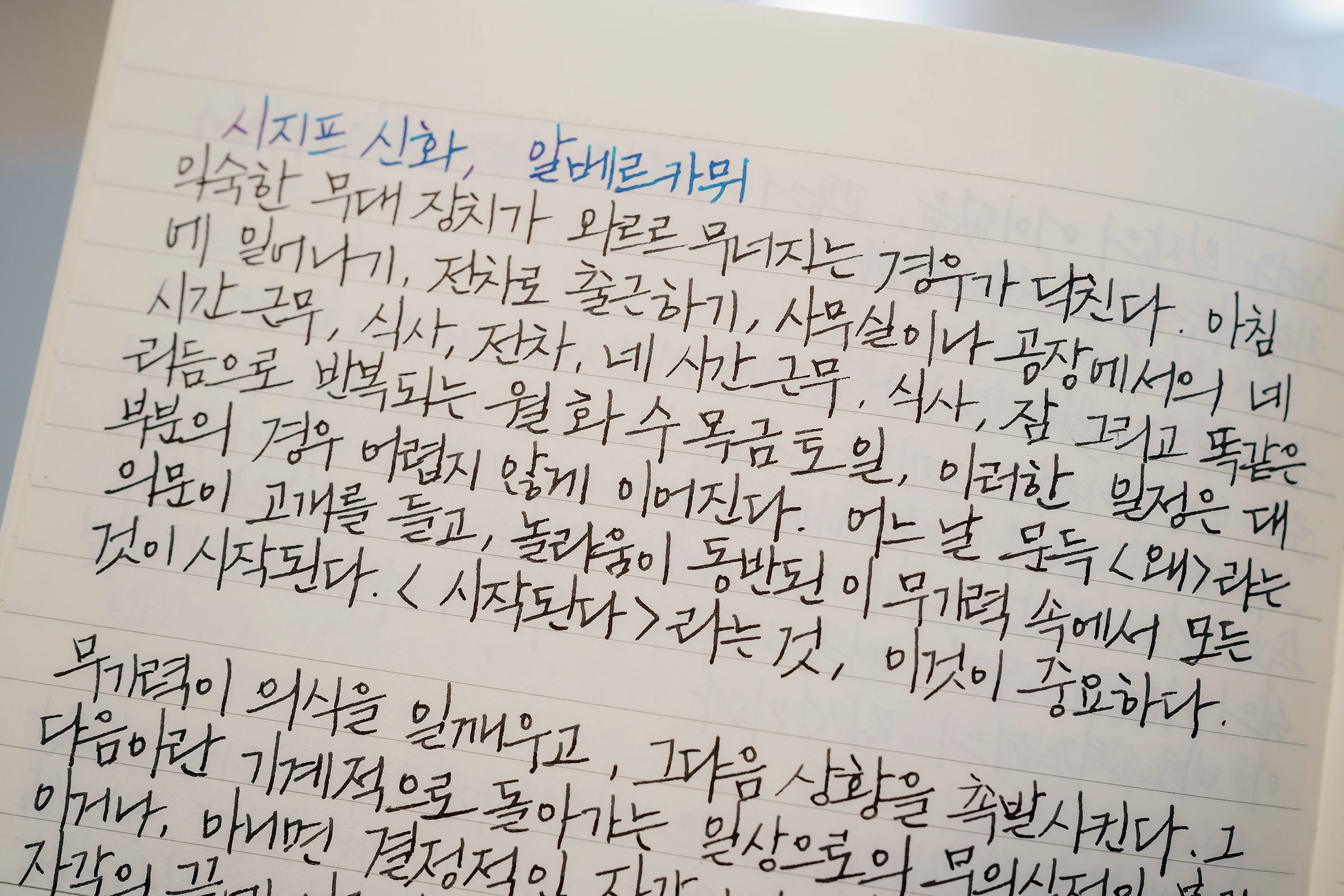
익숙한 무대 장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닥친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차로 출근하기,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의 네 시간 근무, 식사, 전차, 네 시간 근무, 식사, 잠 그리고 똑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한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어렵지 않게 이어진다. 어느 날 문득 〈왜〉라는 의문이 고개를 들고, 놀라움이 동반된 이 무기력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

나는 이제 자살의 개념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부조리한 인간에게 어떤 해결책을 부여할 수 있을지 이미 생각해 보았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역전된다. 앞에서는 삶이 살아갈 만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삶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운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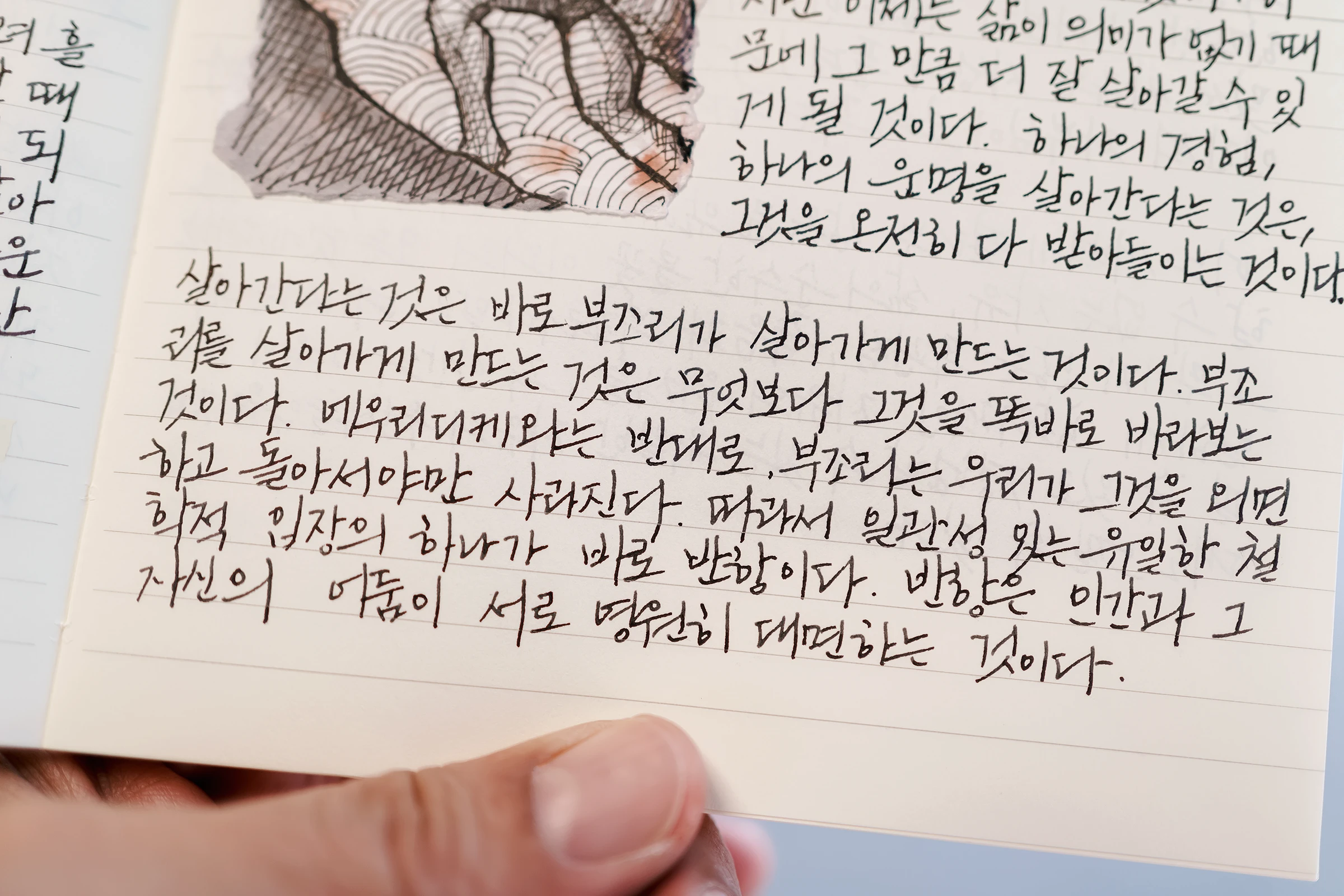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부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부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에우리디케와는 반대로, 부조리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서야만 사라진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유일한 철학적 입장의 하나가 바로 반항이다. 반항은 인간과 그 자신의 어둠이 서로 영원히 대면하는 것이다.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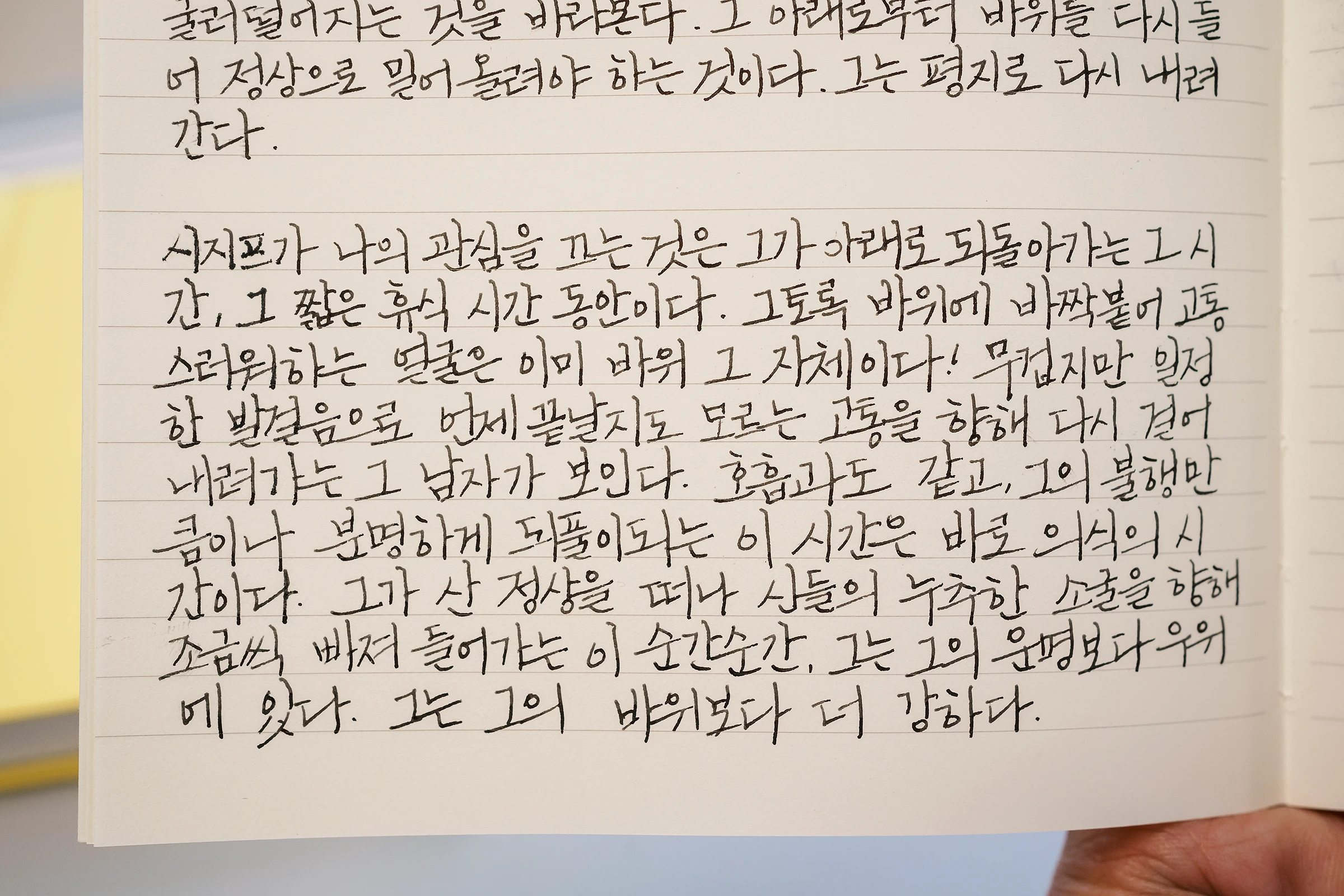
시지프가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아래로 되돌아가는 그 시간, 그 짧은 휴식 시간 동안이다.<중략>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을 향해 다시 걸어 내려가는 그 남자가 보인다. 호흡과도 같고, 그의 불행만큼이나 분명하게 되풀이되는 이 시간은 바로 의식의 시간이다. 그가 산 정상을 떠나 신들의 누추한 소굴을 향해 조금씩 빠져 들어가는 이 순간순간, 그는 그의 운명보다 우위에 있다.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