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사소한 것들

아일랜드의 모자 보호소와 막달레나 세탁소에서 고통받았던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처럼 사소한 것들>의 첫 장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문구와 맞닥뜨리게 된다. 순간, 책을 내려놓고 싶었다. ‘막달레나 세탁소’라는 키워드가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막달레나 세탁소에 수용된 적이 있다고 밝혔던 가수 ‘시네이드 오코너’ 그리고 영화 ‘막달레나 시스터스’ 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한 묶음으로 떠올랐다. (‘Nothing Compares 2 U’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시네이드 오코너가 사망하였다는 뉴스를 최근에 본 기억이 있다.)
Sinéad O’Connor – Nothing Compares 2 U

The Magdalene Sisters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막달레나 수녀원(세탁소)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까지 운영했던 수용소로 약 3만 여명의 여성과 아이의 인권을 짓밟는 폭력과 억압의 현장이었다. 정부가 강제 폐쇄했으나 관련자들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배상도 거부해서 아직도 공방 중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감정 소모가 많은 무거운 이야기일듯해서 피하고 싶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책이 얇다는 사실이 다음 장을 넘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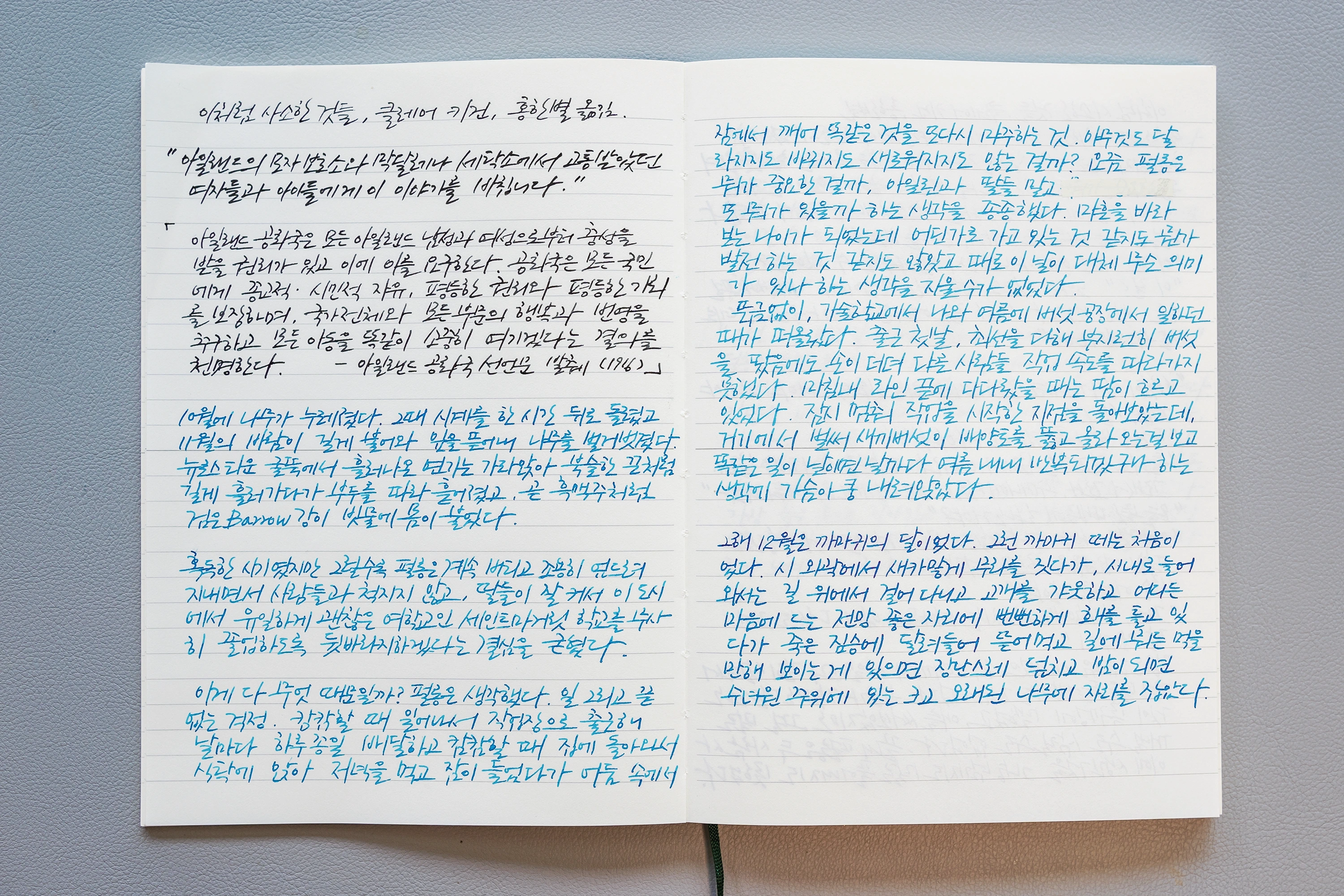
“10월에 나무가 누레졌다. 그때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의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 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슬한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barrow) 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P. 11>
”이 짧은 소설은 차라리 시였고, 언어의 구조는 눈 결정처럼 섬세했다. 잘못 건드리면 무너지고 녹아내릴 것 같았다.” 옮긴이 홍한별 번역가의 말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미지로 변환하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아주 천천히 곱씹어야 했다. 읽고 또 읽느라 느리게 삼킨 문장, 이것은 소설의 언어가 아니고 시의 언어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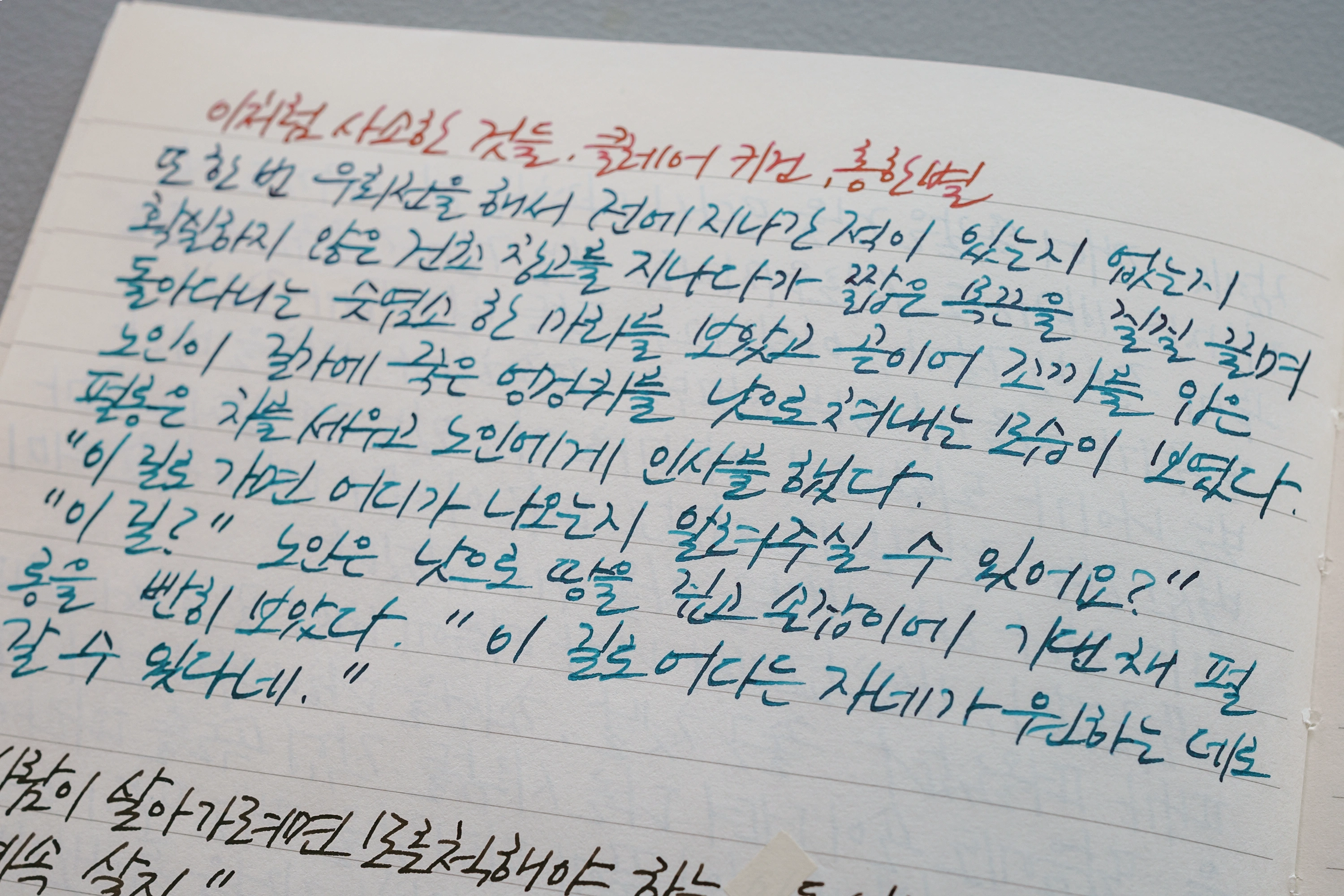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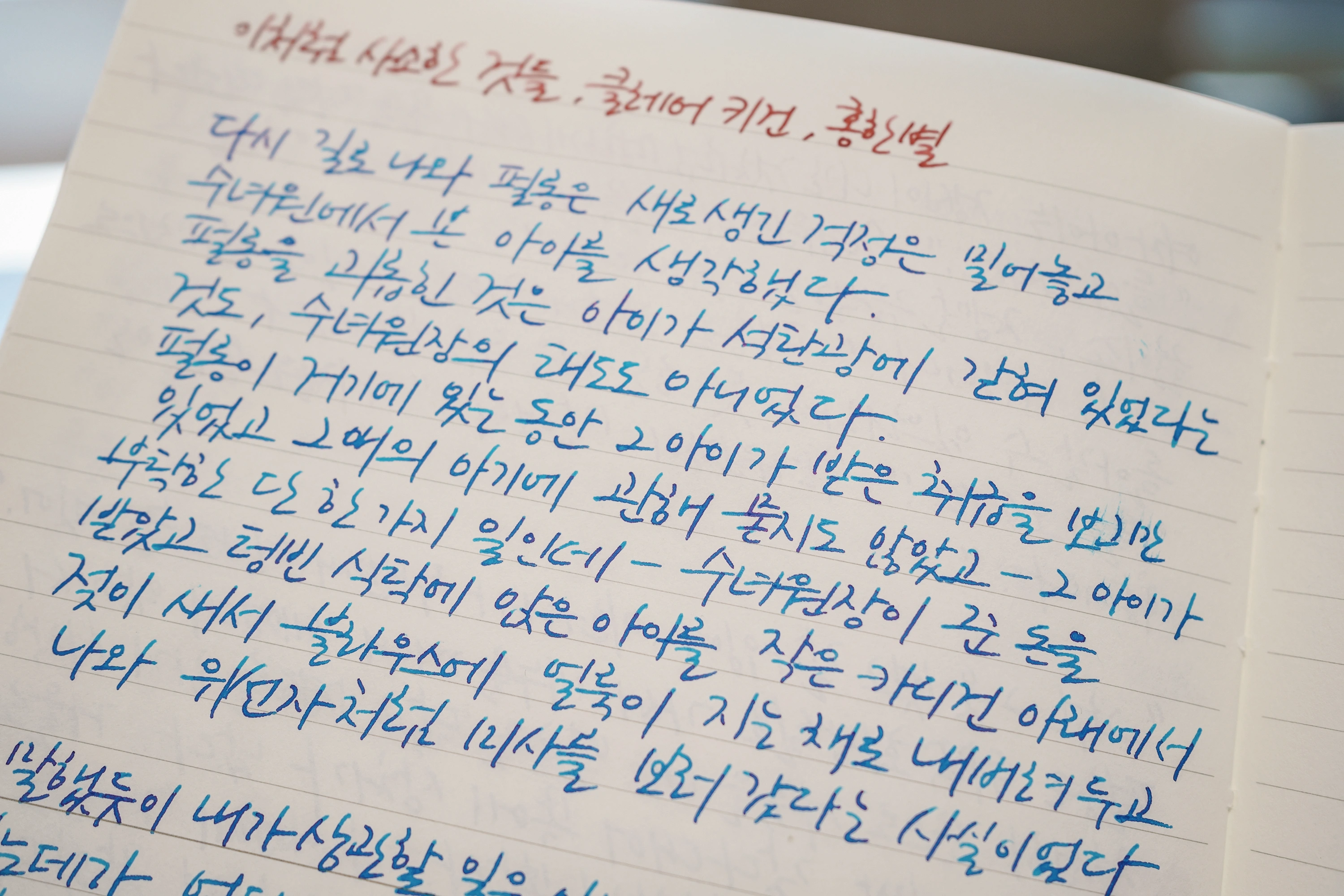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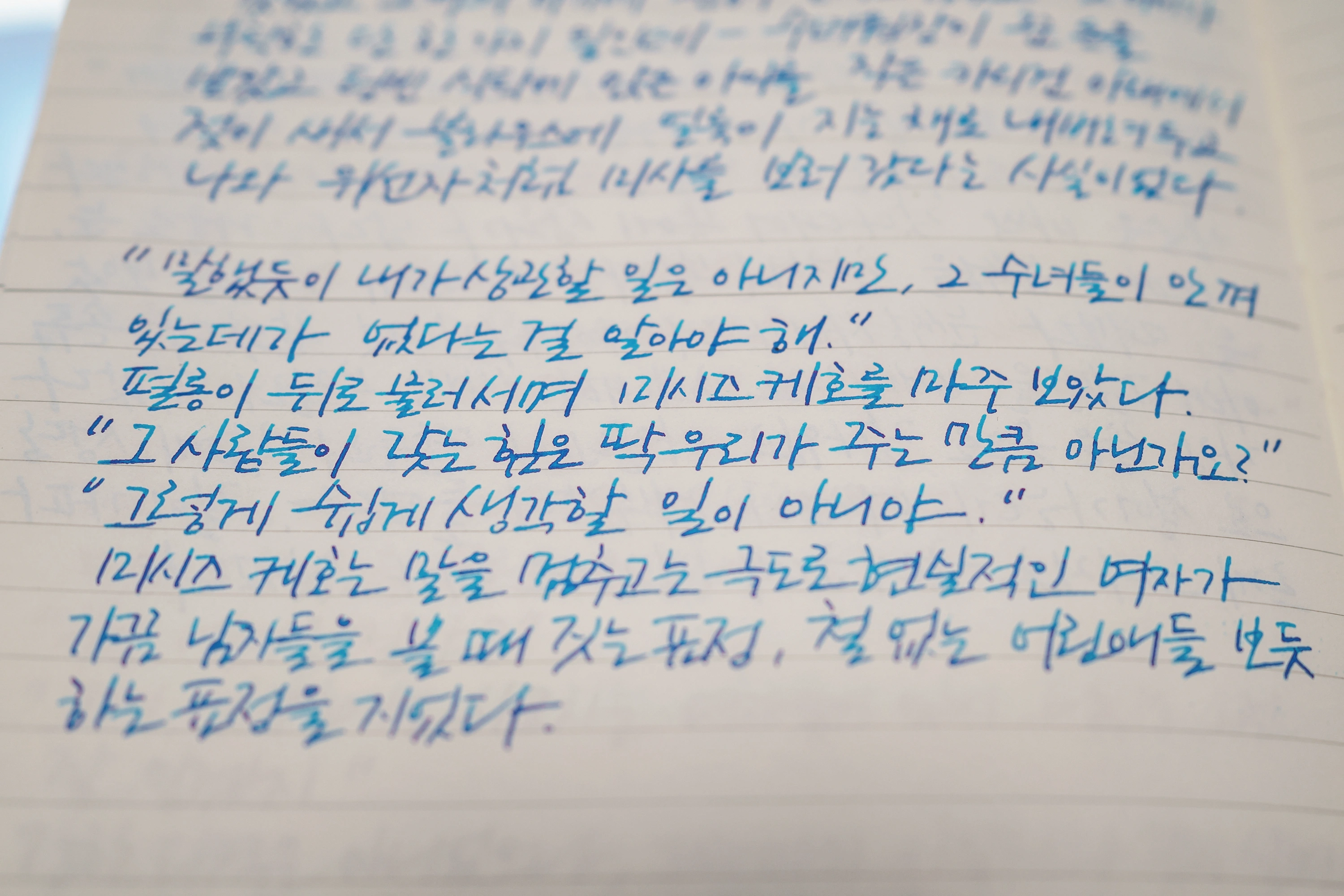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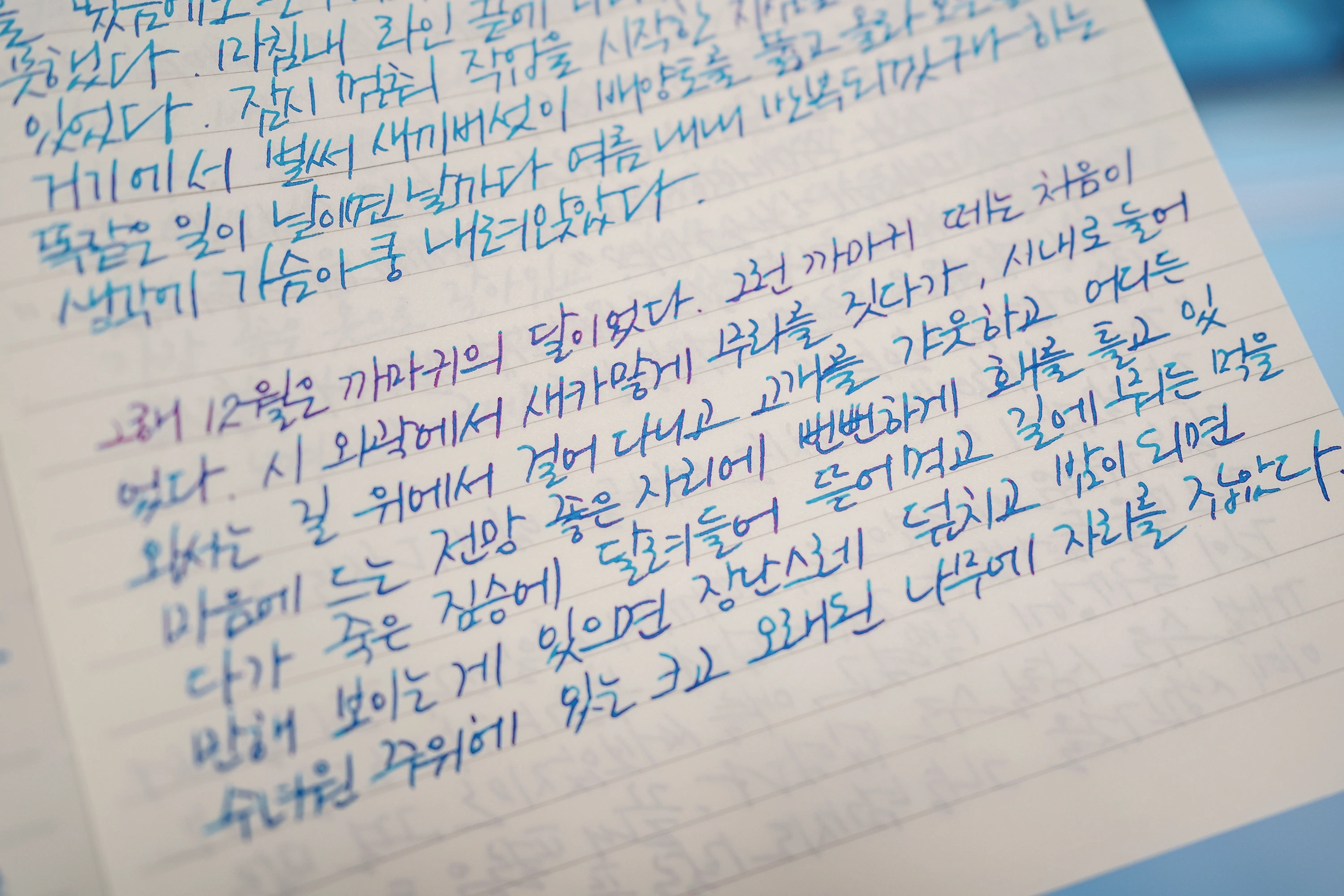
이야기는 짧고 잔잔한 드라마다. 첫 장을 넘길 때의 염려와 달리 열린 결말의 형식을 띠며 다소 밋밋하게(?) 맺었다. 소설로서만 이 이야기를 본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끝낸다고?’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해된다. 마지막 장을 읽고 책을 덮었을 때 ‘다행이다’ 싶었다. 읽는 동안 스트레스를 주었던 불안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불편해졌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소함’은 중의성을 갖고 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슨 책임이 있냐?”며 나와는 관계없는 사소한 일로 선을 긋는 아일린(주인공의 아내)의 태도와 같고,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았던’ 다정함과 사랑을 담고 있다. 하루 종일 펄롱(주인공)의 감정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다.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오버랩되었다. 부조리에 침묵했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떠올랐다. 어쩌면 이런 불편함 또한 작가가 유도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클레어 키건은 ‘막달레나 수녀원’이라는 악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는 마주쳤던 악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사소한 것들’로 규정하고 외면하지는 않았던가? 책을 덮고서 한참 동안 그런 불편한 질문에 묶여있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이 관심으로 변화하고 행동으로 발현했을 때, 평생 묶여버릴지 모르는 후회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 은 지나갔다.” <P. 121>
<이처럼 사소한 것들>은 시를 감상하듯 단어와 문장 그리고 행간에 담긴 은유와 암시 그리고 감정을 읽는 과정이 필요했다. 다시 읽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재독을 권한다.

